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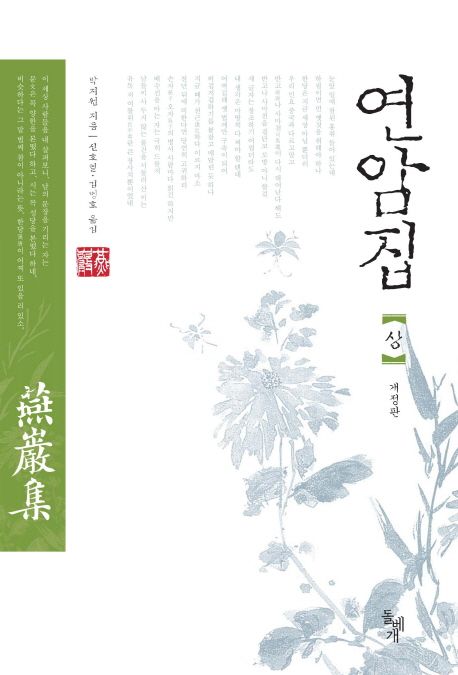
-
연암집 상
저자 : 박지원
출판사 : 돌베개
출판년 : 2007
ISBN : 9788971992678
책소개
남북한 통틀어 최초로 완역한 〈연암집〉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이자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의 문집 〈연암집〉을 완역한 책이다. 남북한을 통틀어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국내 연암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학문적 성과이다. 2005년에 간행되었던「국역 연암집」을 1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새롭게 펴냈다. 학계의 연암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한 '전문적 학술 번역'을 추구하였다.
이 책은 1932년 활자본으로 간행된 박영철 편 〈연암집〉을 텍스트로 하되 주요 이본들을 대조하여 연암의 시문 전부를 국역하였다. 한학의 대가인 우전 신호열이 생전에 구술한 국역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연암 박지원 전문 연구가인 김명호가 수정 가필하고 주해를 가하여 완성하였다. 연암의 시문이 가진 멋을 살리면서도 정확한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암의 산문, 서간문, 비문, 서문, 발문, 소품문, 한문소설 등에 대한 충실한 주해를 전해준다. 특히 198행에 달하는 장편 한시 '해인사'를 비롯한 40여 편의 한시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어, 시인 박지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상권)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이자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의 문집 〈연암집〉을 완역한 책이다. 남북한을 통틀어 국내 최초로 완역한 것으로, 국내 연암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학문적 성과이다. 2005년에 간행되었던「국역 연암집」을 1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새롭게 펴냈다. 학계의 연암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한 '전문적 학술 번역'을 추구하였다.
이 책은 1932년 활자본으로 간행된 박영철 편 〈연암집〉을 텍스트로 하되 주요 이본들을 대조하여 연암의 시문 전부를 국역하였다. 한학의 대가인 우전 신호열이 생전에 구술한 국역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연암 박지원 전문 연구가인 김명호가 수정 가필하고 주해를 가하여 완성하였다. 연암의 시문이 가진 멋을 살리면서도 정확한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암의 산문, 서간문, 비문, 서문, 발문, 소품문, 한문소설 등에 대한 충실한 주해를 전해준다. 특히 198행에 달하는 장편 한시 '해인사'를 비롯한 40여 편의 한시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어, 시인 박지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상권)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개정판 『연암집』을 펴내며
2007년에 국역 『연암집』 간행 이후 이 책은 상ㆍ중ㆍ하 3권에 달하는 분량과 중후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암의 문학이 지닌 풍부한 예술성과 사상성이 시대를 초월해 현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때문일 것이다. 엄정한 원문 교감과 충실한 주해를 바탕으로 한 완역 정본이라는 점 또한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본다.
2012년 개정판 1쇄는 최근 공개된 단국대학교 연민문고(淵民文庫) 소장 연암 관련 문헌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연민문고 소장 연암 관련 문헌 중에는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 10여 종과 아울러, 『겸헌만필』(謙軒漫筆), 『연암산고』(燕岩散稿), 『연암집 초고보유』(燕巖集草稿補遺), 『영대정집』(映帶亭集), 『유상곡수정집』(流觴曲水亭集), 계서본(溪西本) 『연암집』 등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귀중한 『연암집』 이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의 역자인 김명호 교수는 이러한 문헌들에 대한 해제(解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시금 『연암집』을 새롭게 정독했으며, 아울러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연암집』 등 해외 자료들도 입수하여 검토했다.
금번 개정판은 이 같은 새로운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수년 간의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초판의 번역문과 주해 및 원문을 크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암집』, 남북한 통틀어 최초로 완역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요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1737~1805)의 문집 『연암집』을 완역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암의 문집으로는 『열하일기』와 『과농소초』가 완역된 바 있으나, 『연암집』의 시문은 남북한을 통틀어 이번에 처음으로 완역되었다.
특히 이 책에는 연암의 한시, 서간문, 비문, 서문, 발문, 소품문, 한문소설 등이 빠짐없이 담겨 있는데, 198행에 달하는 장편 한시 「해인사」를 비롯한 40여 편의 한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시인’ 박지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일찍이 구한말의 학자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은 연암 박지원을 ‘조선 시대 최고의 산문 작가’로 칭송한 바 있다. 그처럼 드높은 평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작품을 번역한 선집 몇 종만 출간되었다. 연암의 연구는 북한이 남한보다 조금 앞섰는데, 해방 후 1955년 연암 서거 15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하일기』가 처음 완역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 벽초 홍명희의 아들 홍기문洪起文에 의해 『박지원 작품선집』이 번역 출간되었다. 홍기문의 이 책은 연암의 시문을 3분의 1 가량 번역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번역 분량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도록 의역을 위주로 한 것이고, 연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안 돼 있고 참고 자료도 부족해 번역의 오류와 한계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남한에서도 이가원李家源·이우성李佑成 선생을 필두로 연암의 작품을 번역한 선집들이 여러 종 출간되었지만 홍기문의 책을 뛰어넘는 분량과 수준의 것은 아직 없었다.
연암 박지원이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와 번역이 늦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연암의 글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연암은 정통 고문체와 패관소품체稗官小品體, 조선식 한자 표현 등을 망라하여 다채로운 문체를 구사했을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문학·역사·철학, 해외 지리와 천주교, 서얼 차별과 노비 문제, 화폐 문제, 심지어 범죄 사건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글들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번역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한학의 대가인 우전 신호열 선생과 연암 박지원 전문 연구가인 김명호 선생이 공역한 책으로, 학술 번역의 전범을 보여줄뿐더러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로 완역되는 것이다. 『연암집』 완역을 계기로, 그동안 국내 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홍기문의 번역본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암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장을 마련했다 할 것이다.
학술 번역의 전범이본 대조, 원문 교감, 충실한 주해
이 책은 1932년 활자본으로 간행된 박영철朴榮喆 편 『연암집』을 텍스트로 해서 연암 박지원의 시문詩文 전부를 국역한 것이다. 현재 연암의 문집은 선집 또는 전집의 형태로 활자본과 필사본을 합쳐 모두 십수 종이 전하고 있다. 그중 박영철 편 『연암집』은 연암 후손가에서 보관해 온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을뿐더러, 작품을 가장 광범하게 수록하고 있고 대중적으로도 널리 보급된 텍스트이다. 거기에 수록된 연암의 산문 237편과 한시 42수를 처음으로 완역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창강 김택영이 『연암집』을 편찬하면서 종종 임의로 개작했던 것과 달리, 박영철이 펴낸 『연암집』은 필사본의 원문을 존중하여 함부로 고치지 않았고 또한 연암의 전全 저술을 모아 최초로 공간한 점에서, 박영철의 친일親日 행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간행 과정에서 필사본의 원문 판독 오류가 적지 않았고, 인쇄에서 발생한 오자·탈자가 많았다. 그리고 필사본 원문 자체의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으며, 필사본의 편차를 그대로 따른 결과 편차가 정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점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은 박영철 편 『연암집』을 텍스트로 하되 주요 이본들을 대조하여 원문을 철저히 교감한 위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필요한 충실한 주해를 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계의 연암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한 ‘전문적 학술 번역’을 추구하였다. (이본 대조의 과정과 성과는 이 책의 「해제」 참조.)
이 책은 ‘국역 연암집’(1·2)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국역 연암집’은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서 체제와 간행 일정에 맞추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간행물인 관계로 일반 독자에게 널리 보급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다시 1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수정 보완 작업을 하면서 기존 책에 있던 번역이나 인쇄상의 사소한 오류까지 놓치지 않고 바로잡는 한편, 『한국문집총간』 표점본標點本에 의거했던 원문 구두句讀를 전면 교열하여 저본이 되는 텍스트의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다. 번역문 각주 역시 수정 보완해서 더욱 충실한 주해가 되도록 하고, 새로운 이본들을 추가 대조하여 원문 교감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번역문 각주와 원문 각주를 합해 약 4,000개에 달하는 주석이 붙게 되었다. 말미에는 총색인을 붙여 『연암집』을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용이하게 하였다. 돌베개본은 1년의 수정 작업을 통해 보다 완벽한 결정판이 되었다.
,b〉사제간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학문적 업적
이 책은 한학의 대가인 우전 신호열雨田 辛鎬烈(1914∼1993) 선생이 생전에 구술口述하신 『연암집』 국역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전 선생의 문하생으로 연암 문학을 전공한 김명호 교수가 수정 가필하고 주해를 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우전 신호열 선생은 생전에 고 이가원, 임창순 선생 등과 함께 손꼽히는 한학의 대가셨다. 우전 선생은 일찍이 1978년부터 매주 『연암집』 강독회를 열고 작고할 때까지 연암의 글들을 국역·구술하셨다. 그 뒤 문하생들이 선생의 유업遺業으로 『연암집』 국역 출간을 기획했으나 선생의 구술을 받아 적은 원고가 방대한 분량이라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문하생 중에 연암 문학을 전공한 김명호 교수가 이 일을 맡아 드디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연암집』(상·중·하)은 20여 년 간 이어져 온 사제간의 학문적 열정이 만들어 낸 업적인 셈이다.
연암의 시문에 대한 완역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학계의 연암 연구와 관련 집필도 홍기문의 『박지원 작품선집』을 저본으로 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완역된 『연암집』의 출간은 종래와 같이 어느 일면에 치우치거나 국한되지 않고 연암 문학의 총체적인 실상實相을 다각도로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7년에 국역 『연암집』 간행 이후 이 책은 상ㆍ중ㆍ하 3권에 달하는 분량과 중후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암의 문학이 지닌 풍부한 예술성과 사상성이 시대를 초월해 현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때문일 것이다. 엄정한 원문 교감과 충실한 주해를 바탕으로 한 완역 정본이라는 점 또한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본다.
2012년 개정판 1쇄는 최근 공개된 단국대학교 연민문고(淵民文庫) 소장 연암 관련 문헌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연민문고 소장 연암 관련 문헌 중에는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 10여 종과 아울러, 『겸헌만필』(謙軒漫筆), 『연암산고』(燕岩散稿), 『연암집 초고보유』(燕巖集草稿補遺), 『영대정집』(映帶亭集), 『유상곡수정집』(流觴曲水亭集), 계서본(溪西本) 『연암집』 등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귀중한 『연암집』 이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책의 역자인 김명호 교수는 이러한 문헌들에 대한 해제(解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시금 『연암집』을 새롭게 정독했으며, 아울러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연암집』 등 해외 자료들도 입수하여 검토했다.
금번 개정판은 이 같은 새로운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수년 간의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초판의 번역문과 주해 및 원문을 크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암집』, 남북한 통틀어 최초로 완역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요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1737~1805)의 문집 『연암집』을 완역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암의 문집으로는 『열하일기』와 『과농소초』가 완역된 바 있으나, 『연암집』의 시문은 남북한을 통틀어 이번에 처음으로 완역되었다.
특히 이 책에는 연암의 한시, 서간문, 비문, 서문, 발문, 소품문, 한문소설 등이 빠짐없이 담겨 있는데, 198행에 달하는 장편 한시 「해인사」를 비롯한 40여 편의 한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시인’ 박지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일찍이 구한말의 학자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은 연암 박지원을 ‘조선 시대 최고의 산문 작가’로 칭송한 바 있다. 그처럼 드높은 평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작품을 번역한 선집 몇 종만 출간되었다. 연암의 연구는 북한이 남한보다 조금 앞섰는데, 해방 후 1955년 연암 서거 15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하일기』가 처음 완역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 벽초 홍명희의 아들 홍기문洪起文에 의해 『박지원 작품선집』이 번역 출간되었다. 홍기문의 이 책은 연암의 시문을 3분의 1 가량 번역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번역 분량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도록 의역을 위주로 한 것이고, 연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안 돼 있고 참고 자료도 부족해 번역의 오류와 한계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남한에서도 이가원李家源·이우성李佑成 선생을 필두로 연암의 작품을 번역한 선집들이 여러 종 출간되었지만 홍기문의 책을 뛰어넘는 분량과 수준의 것은 아직 없었다.
연암 박지원이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와 번역이 늦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연암의 글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연암은 정통 고문체와 패관소품체稗官小品體, 조선식 한자 표현 등을 망라하여 다채로운 문체를 구사했을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의 문학·역사·철학, 해외 지리와 천주교, 서얼 차별과 노비 문제, 화폐 문제, 심지어 범죄 사건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글들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번역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한학의 대가인 우전 신호열 선생과 연암 박지원 전문 연구가인 김명호 선생이 공역한 책으로, 학술 번역의 전범을 보여줄뿐더러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로 완역되는 것이다. 『연암집』 완역을 계기로, 그동안 국내 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홍기문의 번역본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암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장을 마련했다 할 것이다.
학술 번역의 전범이본 대조, 원문 교감, 충실한 주해
이 책은 1932년 활자본으로 간행된 박영철朴榮喆 편 『연암집』을 텍스트로 해서 연암 박지원의 시문詩文 전부를 국역한 것이다. 현재 연암의 문집은 선집 또는 전집의 형태로 활자본과 필사본을 합쳐 모두 십수 종이 전하고 있다. 그중 박영철 편 『연암집』은 연암 후손가에서 보관해 온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신뢰할 수 있을뿐더러, 작품을 가장 광범하게 수록하고 있고 대중적으로도 널리 보급된 텍스트이다. 거기에 수록된 연암의 산문 237편과 한시 42수를 처음으로 완역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창강 김택영이 『연암집』을 편찬하면서 종종 임의로 개작했던 것과 달리, 박영철이 펴낸 『연암집』은 필사본의 원문을 존중하여 함부로 고치지 않았고 또한 연암의 전全 저술을 모아 최초로 공간한 점에서, 박영철의 친일親日 행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간행 과정에서 필사본의 원문 판독 오류가 적지 않았고, 인쇄에서 발생한 오자·탈자가 많았다. 그리고 필사본 원문 자체의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으며, 필사본의 편차를 그대로 따른 결과 편차가 정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점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은 박영철 편 『연암집』을 텍스트로 하되 주요 이본들을 대조하여 원문을 철저히 교감한 위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필요한 충실한 주해를 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계의 연암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한 ‘전문적 학술 번역’을 추구하였다. (이본 대조의 과정과 성과는 이 책의 「해제」 참조.)
이 책은 ‘국역 연암집’(1·2)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국역 연암집’은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서 체제와 간행 일정에 맞추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간행물인 관계로 일반 독자에게 널리 보급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다시 1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수정 보완 작업을 하면서 기존 책에 있던 번역이나 인쇄상의 사소한 오류까지 놓치지 않고 바로잡는 한편, 『한국문집총간』 표점본標點本에 의거했던 원문 구두句讀를 전면 교열하여 저본이 되는 텍스트의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다. 번역문 각주 역시 수정 보완해서 더욱 충실한 주해가 되도록 하고, 새로운 이본들을 추가 대조하여 원문 교감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번역문 각주와 원문 각주를 합해 약 4,000개에 달하는 주석이 붙게 되었다. 말미에는 총색인을 붙여 『연암집』을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용이하게 하였다. 돌베개본은 1년의 수정 작업을 통해 보다 완벽한 결정판이 되었다.
,b〉사제간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학문적 업적
이 책은 한학의 대가인 우전 신호열雨田 辛鎬烈(1914∼1993) 선생이 생전에 구술口述하신 『연암집』 국역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전 선생의 문하생으로 연암 문학을 전공한 김명호 교수가 수정 가필하고 주해를 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우전 신호열 선생은 생전에 고 이가원, 임창순 선생 등과 함께 손꼽히는 한학의 대가셨다. 우전 선생은 일찍이 1978년부터 매주 『연암집』 강독회를 열고 작고할 때까지 연암의 글들을 국역·구술하셨다. 그 뒤 문하생들이 선생의 유업遺業으로 『연암집』 국역 출간을 기획했으나 선생의 구술을 받아 적은 원고가 방대한 분량이라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문하생 중에 연암 문학을 전공한 김명호 교수가 이 일을 맡아 드디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연암집』(상·중·하)은 20여 년 간 이어져 온 사제간의 학문적 열정이 만들어 낸 업적인 셈이다.
연암의 시문에 대한 완역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학계의 연암 연구와 관련 집필도 홍기문의 『박지원 작품선집』을 저본으로 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완역된 『연암집』의 출간은 종래와 같이 어느 일면에 치우치거나 국한되지 않고 연암 문학의 총체적인 실상實相을 다각도로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연암집 제1권 - 연상각선본
이자후의 득남을 축하한 시축의 서문
회우록서
초정집서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증정한 서문
족형 도위공의 환갑에 축수하는 서문
홍범우익서
해인사에서 창수한 시의 서문
담연정기
합천 화양동 병사기
영사암기
이존당기
안의현 사직단 신우기
안의현 여단 신우기
백척오동각기
공작관기
하풍죽로당기
독락재기
안의현 현사에서 곽후를 제사한 기
충신 증 대사헌 이공 술원 정려음기
거창현 오신사기
함양군 학사루기
함양군 홍학재기
발승암기
소단적치인
옥새론
김 유인 사장
열녀 함양 박씨전 병서
연암집 제2권 - 연상각선본
삼종질 종악 이 정승에 제수됨을 축하하고 이어 시노 문제를 논한 편지
김우상 이소에게 축하하는 편지
현풍현 살옥의 원범을 잘못 기록한 데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밀양 김귀삼의 의옥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함양 장수원의 의옥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밀양의 의옥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진정에 대해 단성 현감 이후에게 답함
진정에 대해 대구 판관 이후 단형에게 답함
남 직각 공철에게 답함
- 부 원서
족형 윤원씨에게 답함
- 부 원서
원도에 대해 임형오에게 답함
함양 군수 윤광석에게 보냄
족제 이원에게 보냄
공주 판관 김응지에게 답함
응지에게 답함 1
응지에게 답함 2
응지에게 답함 3
응지에게 답함 4
응지에게 보냄
이중존에게 답함 1
이중존에게 답함 2
이중존에게 답함 3
진정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1
진정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2
순찰사에게 올림
- 부 병영에 올린 보첩의 초본
순찰사에게 답함 1
순찰사에게 답함 2
- 부 감사의 자핵소 초본
족손 증 홍문관 정자 박군 묘지명
맏누님 증 정부인 박씨 묘지명
맏형수 공인 이씨 묘지명
홍덕보 묘지명
치암 최옹 묘갈명
이 처사 묘갈명
증 사헌부 지평 예군 묘갈명
참봉 왕군 묘갈명
가의대부 행 삼도통제사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시 충강 이공 신도비명 병서
주공탑명
일러두기
해제
연암집 제1권 - 연상각선본
이자후의 득남을 축하한 시축의 서문
회우록서
초정집서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증정한 서문
족형 도위공의 환갑에 축수하는 서문
홍범우익서
해인사에서 창수한 시의 서문
담연정기
합천 화양동 병사기
영사암기
이존당기
안의현 사직단 신우기
안의현 여단 신우기
백척오동각기
공작관기
하풍죽로당기
독락재기
안의현 현사에서 곽후를 제사한 기
충신 증 대사헌 이공 술원 정려음기
거창현 오신사기
함양군 학사루기
함양군 홍학재기
발승암기
소단적치인
옥새론
김 유인 사장
열녀 함양 박씨전 병서
연암집 제2권 - 연상각선본
삼종질 종악 이 정승에 제수됨을 축하하고 이어 시노 문제를 논한 편지
김우상 이소에게 축하하는 편지
현풍현 살옥의 원범을 잘못 기록한 데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밀양 김귀삼의 의옥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함양 장수원의 의옥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밀양의 의옥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진정에 대해 단성 현감 이후에게 답함
진정에 대해 대구 판관 이후 단형에게 답함
남 직각 공철에게 답함
- 부 원서
족형 윤원씨에게 답함
- 부 원서
원도에 대해 임형오에게 답함
함양 군수 윤광석에게 보냄
족제 이원에게 보냄
공주 판관 김응지에게 답함
응지에게 답함 1
응지에게 답함 2
응지에게 답함 3
응지에게 답함 4
응지에게 보냄
이중존에게 답함 1
이중존에게 답함 2
이중존에게 답함 3
진정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1
진정에 대해 순찰사에게 답함 2
순찰사에게 올림
- 부 병영에 올린 보첩의 초본
순찰사에게 답함 1
순찰사에게 답함 2
- 부 감사의 자핵소 초본
족손 증 홍문관 정자 박군 묘지명
맏누님 증 정부인 박씨 묘지명
맏형수 공인 이씨 묘지명
홍덕보 묘지명
치암 최옹 묘갈명
이 처사 묘갈명
증 사헌부 지평 예군 묘갈명
참봉 왕군 묘갈명
가의대부 행 삼도통제사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시 충강 이공 신도비명 병서
주공탑명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